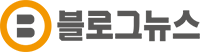"지금 의식을 회복해서 맥박이 뛰고 모두 집에 못 가고 치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9일 제주시 한 명상수련원 앞에서 한 남성이 수련원에 들어오려는 여성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 여성은 남편 B씨가 수련원에 들어간 뒤 한달 넘게 연락이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이곳을 찾은 터였다.
그러나 명상수련원 원장 A씨(60)의 답변은 황당했다.
남편이 수련원에서 한달 전인 9월1일 심장마비로 죽어서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금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틀만 참아달라"면서 B씨 아내를 돌려보냈다.
B씨 아내는 며칠 뒤 다시 수련원을 찾았으나 이번에도 A씨는 "많이 좋아졌다. 맥도 뛰고 피부도 돌아왔다. 오늘 여기 있어도 남편을 볼 수 없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다시 돌려보냈다.
평소 명상을 좋아하던 B씨는 지난해 8월30일 이전부터 즐겨찾던 제주 모 명상수련원을 찾았다.
1박2일 일정이었지만 B씨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약 45일 뒤 그는 수련실에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명상수련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B씨는 수련원에 온 다음 날인 9월1일 오후 8시30분쯤 3층 수련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훗날 부검결과에서 B씨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으면 119에 신고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원장 A씨는 수련실에 올라가는 계단에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된 가림막을 설치했다.
다른 수련원 회원들에게는 3층 수련실이 공사 중이라고 속여 출입을 막았다.
이때부터 A씨는 기이한 행동을 한다. 단순히 수련원 평판을 고려해 시신을 숨긴 게 아니었다.
A씨는 경찰에 "기적을 일으켜 B씨를 살려내려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가 한 행동을 보면 시신에 주사기로 흑설탕물을 먹이고 이불로 얼굴 부분은 제외하고 덮는 등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했다.
또 시신을 알코올로 닦고 주변에 모기장을 설치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수련원에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행동은 B씨가 숨지고 약 45일째인 10월15일 경찰이 출동해서야 끝이 난다.
A씨는 수련원에 온 경찰에게조차 "B씨가 명상 수련 중이다. 깊은 명상에 빠져 있어서 충격을 주거나 소란을 피우면 죽을 수 있다. 영장을 가져오라"며 막았다.
사체은닉과 유기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사체은닉은 유죄, 유기치사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련원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명상 중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수련원 원장측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서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논리를 펴 유기치사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유기치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A씨가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발견하고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명확지 않았다.
즉 A씨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유기치사로 볼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이 깊은 명상에 빠져 다시 일어날 것이란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유족들에게 숨겼다"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과연 언제까지 시신을 보관했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망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을지는 모르나 친구로서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예를 표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체를 옮긴 것은 아니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