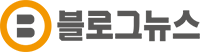자수장 대표 김시인

누가 보아도 고운 것이 있다. 봄날 언 땅에 올라온 새싹이 그렇고, 여름 볕에 타들지 않고 촉촉이 물기를 머금은 꽃잎이 그렇다. 때를 맞춰 물드는 단풍도 밤새 내린 눈 위에 찍힌 첫 번째 발자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늘었다. 저마다의 색을 뽐내는 실이 엮어져 또 하나의 빛깔을 내는 자수가 그것이다. 한평생 들여다봐도 여전히 어여쁜 자수와 함께 행복한 생을 수놓고 있는 김시인 명장과 선생의 자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 어머니의 육아법, 자수 명장을 만들다
어머니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은 아이의 본능과도 같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 가지 일을 일생에 걸쳐 좋아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선생의 머릿속 고스란히 남아 있는 기억은 어머니의 묵묵한 칭찬들이었다.
“당시에는 말로 칭찬하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인가, 완성이라고 할 만한 자수를 작은 천 조각에 처음으로 했어요. 어린아이가 뭐 잘 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버리지 않고 가방으로 완성해 주셨죠. 그게 첫 기억인거 같아요. 그 후에도 무엇이건 그러셨어요. 제가 수를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었죠. 그럼 전 속으로 제가 놓은 수가 좋으신가보다, 했던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린 딸아이가 당신이 하는 것을 따라 조물조물 놓은 수를 본 심정. 아마도 선생의 뿌듯함보다 더 큰 감동으로 수를 쓰다듬으며 어떤 물건을 만들어 줄까, 밤새 고민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쓸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다니는 아이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분명, 주변 친구들은 아이가 들고 있는 가방을 보고 누가한 것이냐, 물었을 것이다.
‘내가 수를 놓고, 엄마가 만들어 줬어’라는 대답에 아마도 ‘우와’하고 감탄했을 테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은 그날, 또한 자신이 놓은 수로 만들어진 베개보를 베고 잠을 청할 때, 아이는 분명 웃었을 것이다.

◆ 차곡차곡 쌓여 이어지는 길
선생의 학창 시절과 젊은 날의 자수는 그렇게 생활이었다. 초등학교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자수를 했다. 아플리케 수, 십자수, 스웨덴 자수 등을 유행처럼 많이들 하던 시절이었다.
시골은 전기도 없던 시절이어서 호롱불이나 촛불 아래에서 수를 놓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선생 스스로도 자수를 어지간히 좋아하긴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어느 날 친척 집에 방문할 때 딱히 가져갈 선물이 없어서 액자를 만들어 들고 갔어요. 친척은 그 액자를 거실 벽에 걸어두었는데, 이모님이 오셔서 이 수를 누가 놓았냐고 물어보셨대요. 사촌 동생이 만들었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당시에는 전통 자수하는 곳도 사람도 없어서 자수 자체가 무척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 사람들을 모아두고 부르면 가서 가르쳐주고, 끝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가르쳐주고 했죠. 그렇게 힘나서 일을 했어요. 좋으니까. 또 가르쳐야 자기 발전이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요.”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일본에서 온 재일교포가 전통 자수를 보러 선생을 찾아왔다. 재일교포는 선생의 자수를 보고 마음에 들어 판매를 권했다. 선생은 그저 좋아서 만든 것이니 그냥 가져가라 말했지만, 그럴 수 없다며 봉투를 두고 갔다.
당시 공무원 월급이 1만 원 내외였는데, 봉투 안에 9만 원이 들어 있었다. 선생의 자수를 처음으로 판매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몽땅 실과 공단을 사들였다. 그때 구입한 재료로 근 10년 수를 놓을 수 있었다.

“돌아보면 참 인연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적성에 맞긴 했지만, 거기에 신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운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선생은 겸손히 이야기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운만으로 생을 이어갈 수는 없는 법이다.

◆ 자수 명장의 길
세월이 흘러 경복궁에서 진행된 전국기능대회에서 1등을 하며 묵향이라는 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1년 한 번씩 공예인 전시도 참여하게 됐다. 인연은 계속 이어져 문예에 뛰어난 재능과 안목을 지닌 이학 선생을 만나 더 큰 무대에 들어서며, 1983년부터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국외 전시에 참여했다.
북유럽, 미국, 호주 등지를 다니며 자수를 통해 한국문화사절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일본에서 3차례에 걸친 전시에 참여하는 등 꾸준히 국내외 전시 활동을 이어갔다. 자수 덕분에 참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고 선생은 회상한다.

여전히 가르치는 일에도 심열을 다한다. 처음 어머니가 해 주셨던 것처럼, 선생에게 배우는 자수는 감상용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 것도 버려지지 않게,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물건으로 만든다.
첫 수업의 작품부터 제대로 쓸 수 있는 물건 완성을 목표로 한다. 꽃 자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자련수부터 이음수, 고난이도지만 섬세한 표현에 꼭 필요한 징금수까지 수의 다양한 방법을 전수한다.

자수는 한 폭 그림을 수놓는 것이다. 그림과 마찬가지로 구성이 무척 중요하다. 꽃과 새를 함께 수놓을 때도 그 둘의 위치와 구성에 따라 자수의 멋이 달라진다. 선생은 자신이 개발한 수 도안이나 방법을 아낌없이 내어 준다.
2016년 개관한 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 2층에 자수관이 있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받는 강의실과 선생의 자수 작품 전시장이 있다. 선생은 지난 작품을 이곳에 기증했다. 전시관 규모는 작지만 작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50년 넘는 세월, 선생에게 자수는 단 한 번의 싫증도 없었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진다. 진심으로 곱다.

[자수장 김시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3호 자수장
성균관 명덕학당 이사
㈔예명원 평생회장 겸 이사
2009년 운현궁 전통자수원장
2012년 한국자수문화협의회장
2015년 ㈔선학회장
2013년 인사동 백악미술관 개인전
2009년 북유럽 수교 50주년 기념전(한국문화사절단)
2003년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관 전시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기념전(한국문화사절단)
관련기사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20. 풍기인견을 자연의 색으로 물들이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9. 한 올 한 올 꽃피운 천년의 향기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8. 의성홍화의 화사한 분홍빛이 세계에 밝혀지길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7. 손수 염색한 천에 꽃 한송이 피워 올리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6. 자연은 거짓말이 없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5.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복처럼 삶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4. 안동포의 날실과 씨실로 세월을 엮어내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3. 무채색의 '먹무늬염'으로 화려하게 피어나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2. 세계 유일한 우리 민화처럼 우아하게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1. 천대받던 무삼에 생명을 불어넣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0.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쪽빛 사랑에 빠지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9.자연에서 얻은 빛깔, 감물에 혼을 담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8.누비는 바느질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7.먹물이 주는 환상적인 무늬에 반하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6.안동포,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하게 변신하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5.안동포와 민화가 만나 또 하나의 예술이 되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4.한평생 지켜온 우리 옷의 아름다움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3.청춘으로 한 올 한 올 베를 짜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2.염색도 사람도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마음으로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1.감물 사랑, 청도의 햇살과 바람을 닮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22. 더 많은 이가 천연의 색을 곁에 두길, 그 하나의 바람으로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23. 바느질의 미학, 3㎝ 바늘 끝에서 피어나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24. 순서에 맞게 지은 한복이 그대로 삶이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25. 쪽빛 감빛, 인생 최고의 보석이 되다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26. 한 땀 한 땀 이어온 위대한 유산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27. 애기똥풀, 쑥, 생쪽 자연 모두가 염색의 재료
- [기획-멋과 색을 짓는 사람들] 28. 버리지 않고 다르게, 명주로 이어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