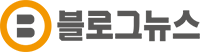[블로그뉴스=정세인 기자] 상처 없는 생이 없다. 사람뿐 아니라 나무도 그러하다.
상처 없는 생도 죽지 않는 삶도 없지만 죽어서 다시 숨을 부여받는 생이 있다.
그것은 때로 예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예림목공예 박동수 장인은 상처입고 죽은 나무로 예술의 숲을 꾸미고 나무 동산을 꿈꾸며 살아간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자연이 있다.
나무를 만지며 차를 마시고 사람과 조우하며 다시 나무와 함께하는 선생의 삶에서 자연을 향하는 예술을 만나본다.

자연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박동수 장인이 나무를 만나 숲을 꿈꾸며 갖게 된 마음이다.
1980년대에 장인은 공예품 생산 공장에서 나무를 처음 만났다.
나무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 생계를 잇는 직업이 되었고, 좋은 것을 따라 살다보니 지금까지 그 길 위에 서있게 됐다.
나무는 자연의 한 부분이면서 그대로 자연 자체였다.
같은 종류의 나무도 같은 모양으로 크지 않고 표면이나 속이나 매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른 그 모습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다. 나무를 포함해 자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달랐다.
그 안에서 품어 나오는 예술은 사람이 결코 따를 수 없는 경지다.
“우리는 유약을 사용하지 않아요. 유약을 바르면 첫 느낌은 매끄럽고 세련되어 보이죠. 반면 빛깔이 탁해져요. 나무 천연의 느낌이 줄어요. 나무 위에 무언가 칠을 하는 것은 옻칠이 유일합니다. 옻칠은 방습,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음식이 직접 닿는 품목에는 옻칠을 하죠. 빛깔이 참 멋지게 살아납니다. 그 외에는 자연 그대로에요. 저는 작업 대부분을 자연적으로 죽은 고사목을 써요. 마당에 한가득 쌓인 나무들이 전부 폐목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두 자재예요. 어떤 나무가 보물로 탄생할 지 알 수 없죠. 주문 고객이 나무 형태를 보고 직접 고르기도 하고, 제 눈에 띄어 어떤 결과물이 되기도 하죠. 지금 저 자체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죽은 나무를 자연스럽게 방치해 두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요. 죽은 후 십년 이상이 지나면 사리목이 돼요. 죽은 나무의 귀한 재생이죠.”

장인은 1990년대에 독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나무로 만드는 민속 예술품 종류를 전반적으로 만들어오다가 지인을 통해 차를 만나게 됐다.
사람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아지고 차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며 차제구 목공예 작업이 늘어갔다.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로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것, 박동수 장인의 삶의 낙이 됐다.
“지금 이 차판도 박달나무 그대로예요. 물이 닿으면 색이 진해지죠. 물이 마르면 다시 본연의 색으로 돌아오고요. 참, 자연스럽죠.”
천연 나무 빛과 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차판 위로 찻물을 내리는 장인의 모습이 빗물에 젖고 햇빛에 마르는 자연과 같다.
차판 위에 단아하게 새겨진 연꽃이 물에 따라 피고 진다.

깨닫지 못하면 볼 수 없다.
예림목공예 작품들의 또 다른 특징은 100% 국내산 목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무들은 나무가 아닌 물건 같아 보여요. 정감이 없죠. 우리 토종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무늬나 질감과 확연히 다르죠. 물론 수입산 특수 목재들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흑단 같은 나무인데요. 흑단만이 가진 검은 색과 단단함 때문에 디자인에 따라 사용하지요. 그 외는 전부 국내산 토종 나무만 고집해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죠.”
제품 생산에 홀로서기를 시작한 당시 IMF 등의 경제 여파로 많은 공예점들이 문을 닫았다.
예림목공예 역시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허나 시간의 흐름도 시대의 변화도 자연스런 흐름으로 놔두었다.
자연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는 것, 고사목에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생을 부여하는 것,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들은 몸소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차를 마시며 또 다른 아이디어로 차제구를 만들고, 그 도구로 다시 차를 마시는 것의 반복,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나무가 준 귀한 지혜다.

차 한 잔 하시지요.
차에 취한다. 함께 하는 사람들에 취하고 주변에 둘러쳐진 나무 향기에 취한다.
박동수 장인 내외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사라진다.
“차 이야기를 나무만큼 좋아해요. 좋은 분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 차와 나무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우리는 오로지 자연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저는 좀 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죠. 누가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저라도 쓴 소리를 해야 쓰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테니까요.”
자연에 늘 감탄하면서도 박동수 장인에게 필요한 악역도 가끔 된다는 사모의 말이다.
시대가 많이 변해 근래에는 좋은 고사목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괜찮은 나무가 있다는 목재상 이야기에 박동수 장인은 늘 마음을 서두른다.
그럴 때 한 번 더 고민을 제안하는 것은 사모의 몫이다.
그럼에도 결국 한 마음으로 나무를 구입한다고.

쌓이는 나무는 당장에 어떤 경제적인 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지니 나무를 보면 욕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욱이 그 안에서 어떤 보물이 탄생할지 아직 아무도 모를 일이다.
장인은 목재 작업장에서 커다란 통나무의 한 면을 전기톱으로 툭 잘라 보인다.
검은 장미가 나무 단면에 활짝 피어난다.
순간 장인이 마술을 부린 듯 느껴지지만 나무의 마법이다.
그리고 그 마법을 발견하는 것이 장인의 힘이다.
죽은 나무에서 예술을 발견해 숲을 이뤄가는 예림목공예의 박동수 장인.
그의 손을 타고 세상의 빛을 받게 될 무한한 자연 예술품이 벌써 궁금해진다.
더 많은 이들이 예림목공예의 차와 나무 향기를 만나길 바란다.
[예림목공예 박동수]
2007~2016년 문경찻사발축제 출품전
2015년 대한민국공예대전 장려상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금상
2016년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전통공예상품 공모전 금상
문경관광기념품공모전 금상
2017년 경북공예대전 금상
제14-1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전수 교육이수
관련기사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5.영혼을 깨우는 목탁 소리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4.첫사랑처럼 설레는 은장도의 매력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3.섬세한 손놀림으로 시대사상을 새기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2.유물 재현과 복제의 아름다움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1.금속의 무한한 변화, 철학을 만나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0.민족의 흥, 장승에 새기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9.나무를 통해 나를 찾아가는 길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8.4대를 잇는 유기장의 힘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7.김천유기의 명맥을 잇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6.김천 징의 부활을 꿈꾸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5.자연에서 금속공예의 미래를 찾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4.국악 세계화의 초석, 국악기 유림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3.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평생을 걸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전통과 생명의 놋그릇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흙과 불이 빚은 황금빛 유기 인생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7.마음의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8.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공예가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9.나무에서 마음의 소리를 찾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0.궁금하면 찾아내는 세상에 대한 애정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1.소나무 같이 편안하고 은은한 향기를 지닌 장인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2.일곱 가지 색채와 불의 예술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3.한 뼘 길이에 구현한 완벽한 세계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4.마음을 울리는 북소리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5(끝).오늘보다 내일 더, 원형 하회탈을 향한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