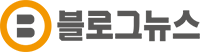[블로그뉴스=정세인 기자] 산이 깊고 계곡이 아름다운 봉화는 하늘이 내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의 고장이다.
봉화를 가로지르는 내성천 상류에 유기로 유명한 마을이 있다.
순도 높은 구리와 주석을 황금 비율로 섞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 놋그릇을 만드는 유기장 김선익 선생의 봉화내성유기다.

순도 99.99% 재료부터 깐깐하게
봉화내성유기가 자리한 신흥마을은 조선 후기부터 놋그릇을 만들던 유기마을이다.
산이 깊어 나무가 흔한 신흥마을은 숯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
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녹이는 일이 먼저였는데 예전에는 숯을 피워 쇠를 녹였으니 숯을 구하기 쉬운 곳에 유기공장을 세운 것이다.
내성천을 건너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커다란 봉화내성유기 간판이 보인다.
전시판매장 067이 앞에 있고, 지척에 유기공장이 있다. 봉화내성유기는 4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가는 장인 집안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유기를 만들었으며, 김선익 유기장이 3대, 장인의 두 아들이 뒤를 잇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4대를 지켜낸 가업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랐으니 김선익 선생에게 유기는 선택이 아니라 그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거들던 수준을 넘어 팔을 걷어붙이고 시작한 것은 군대를 다녀와서부터다.
밥벌이를 해야 했고, 그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익숙한 일이 유기 만들기였다.

유기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식기다. 조선시대에는 놋그릇과 사기그릇이 일반적으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 말에는 유기공장을 폐쇄시키고, 놋그릇을 모두 공출해가는 바람에 해방 후 유기의 수요가 늘었다.
이후 연탄 사용이 많아지면서 연탄가스에 산화녹이 심해지면서 유기를 기피하는 이가 많아지고, 때마침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붐이 일면서 유기는 예전의 명성을 잃어갔다.
90년대 이후 유기가 건강한 식기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유해세균을 억제하고 보온, 보냉 효과가 있어 음식을 담기에 안전하고 더 먹음직스럽다.
유기는 구리 78% 주석 22%의 황금비율로 만들어진다.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리와 주석을 구입할 때도 순도 99.99%의 최고 품질의 재료를 선택한다.
봉화내성유기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본을 지키는 원칙주의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섬세한 관심을 기울인 덕분이다.

조부에서 시작돼 아들까지 4대로 전해진 가업
김선익 선생은 1994년에 경북 무형문화재 유기장으로 지정 받았다.
다음 해인 1995년에는 봉화군에서 특산단지 지정을 받고, 그로부터 20년 뒤인 2015년에는 향토뿌리기업에 선정됐다.
향토뿌리기업은 3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기업만 선정한 것이니 지역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셈이다.
대대로 한 자리에서 가업을 이어온 보람이 있다.

유기공장은 한 두 명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리와 주석을 황금비율로 녹여 틀에 녹인 쇳물을 부어야하고, 식은 틀에서 유기를 꺼내 담금질을 하기까지를 ‘부질’이라고 한다.
이후 거친 면을 깎고, 연마를 하는 건 ‘가질’이라고 한다.
선생은 여러 공정 가운데서도 ‘만들기’를 잘하는데 쇳물을 틀에 부어 유기의 기본을 만드는 과정이다.
판매장 캐비닛 위에 젊은 시절 쇳물 붓는 선생의 모습을 아들이 찍어준 사진이 놓여 있다.
틀에 딱 들어갈 양만 정확하게 가늠해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는 정확한 속도로 붓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오랜 숙련을 거쳐야 가능한 작업이다.
“제품에 작은 티끌만 있어도 폐기해야 됩니다. 잘못 구운 도자기를 깨 버리듯이 하자 있는 유기는 모두 녹여버립니다. 흠이 있는 것을 팔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나쁜 일이 되어 돌아오거든요. 해방 직후에는 구멍만 안 나면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선별 작업을 까다롭게 지켜 품질을 유지합니다.”
유기에 새긴 이름의 무게
유기공장은 신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의 연속이다.
무겁고, 뜨겁고, 위험한 일 투성이다. 김선익 선생은 이제 공장 작업은 아들 둘과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동료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제품 관리, 선별, 포장 등에 전념하고 있다.
선생이 모처럼 깎기 기계 앞에 앉아 포즈를 취해 보인다. 작업대는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이 낡고 닳았다.
기계와 작업대, 도구는 공장에서 쓰기 편하게 제작하고 배치해 손에 꼭 맞는다.
담금질을 해서 거무스름한 유기를 나무틀에 끼워 거친 면을 깎아내자 노란 속살이 드러난다.
깎은 뒤에 연마 공정을 거치면 표면이 더 부드러워지고 광택도 은은한 자연광으로 깊어져 계속 들여다봐도 질리지 않는 유기가 완성된다.
공장 제일 안쪽에는 봉화내성유기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의 원형이 되는 ‘번기’를 모아둔 창고가 있다.
공장에서는 흔히 ‘뻥끼’라고 부른다. 번기가 있어야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쇳물을 부어 식히면 번기와 똑같이 생긴 유기가 나온다.

“놋대야 같은 큰 제품을 제외하면 웬만한 뻥끼는 여기에 다 있어요. 식기며 불기, 제기까지…. 이렇게 많은 종류를 다 갖춘 곳도 잘 없지요.”
번기 밑면에는 ‘무형문화재 제22호 김선익’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자신의 이름을 새긴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자 또한 그만큼의 책임감이기도 하다.
그 이름을 지켜가기 위해 김선익 유기장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느리지만 뚝심 있는 걸음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 길에 두 아들이 함께하니 거칠 것이 없다.
[내성유기공방 김선익]
1936년 출생(경상북도 봉화)
1994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유기장) 인정
1995년 특산단지 지정(봉화군 제2호)
2005년 아들 김형순씨 무형문화재전수교육보조자 선정
2010년 봉화내성유기 판매장 확장 이전
농어촌산업박람회 선정 전국 10대 명품
2015년 향토뿌리기업 선정
관련기사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7.김천유기의 명맥을 잇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6.김천 징의 부활을 꿈꾸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5.자연에서 금속공예의 미래를 찾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4.국악 세계화의 초석, 국악기 유림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3.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평생을 걸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전통과 생명의 놋그릇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흙과 불이 빚은 황금빛 유기 인생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9.나무를 통해 나를 찾아가는 길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0.민족의 흥, 장승에 새기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1.금속의 무한한 변화, 철학을 만나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2.유물 재현과 복제의 아름다움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3.섬세한 손놀림으로 시대사상을 새기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4.첫사랑처럼 설레는 은장도의 매력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5.영혼을 깨우는 목탁 소리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6.예술의 나무숲에서 외길 인생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7.마음의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8.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공예가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19.나무에서 마음의 소리를 찾다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0.궁금하면 찾아내는 세상에 대한 애정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1.소나무 같이 편안하고 은은한 향기를 지닌 장인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2.일곱 가지 색채와 불의 예술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3.한 뼘 길이에 구현한 완벽한 세계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4.마음을 울리는 북소리
- [기획-쇠와 나무를 깨우는 사람들] 25(끝).오늘보다 내일 더, 원형 하회탈을 향한 여정